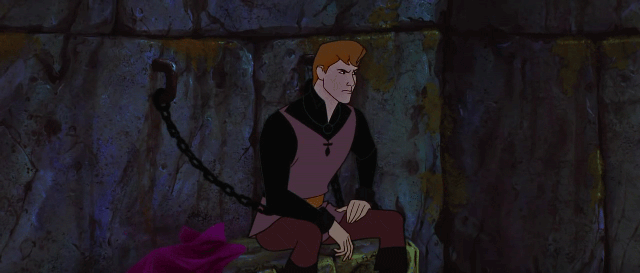
매번 키보드 앞에 앉을 때마다 느끼지만 글쓰기가 참 어렵다. 내가 딱히 완벽주의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. 할 말이 없고 소재가 떨어져서 그러느냐 하면, 그러한 것도 전혀 아니다. 그냥 내 깜냥이 한 문장 한 문장을 내놓지 못하는 것 뿐이다.
방금까지는 한참 전에 기획했으나 쓰다만 글을 다시 한번 조금 이어 써 보았다. 평소에 쓰는 다른 글들과 다르게 설명문에 가까운 글이었다. 보통은 설명문이 논설문보다 쓰기 쉽다는데, 나는 도통 이 설명문이 잘 써지지 않았다. 내용이 어렵다거나 특별한 것도 아닌데 문장이 입 안에서만 돌고 돌았다. 결국 몇 시간을 투자해 글을 썼지만, 지웠다 썼다를 반복한 끝에 고작 세 줄 정도를 더 추가하였다.
이는 창작의 고통이라기보다 비참함에 가깝다. 날개 근육이 찢어질 듯 아픔에도 힘을 쥐어짜 날아오르는 기분이 아니라, 내 등에는 날개가 돋아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몇 번이고 바닥을 구르는 느낌이다.
오늘의 수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은 내일의 용기를 가지고자 한다. 내일은 네 줄 쓰면 된다.